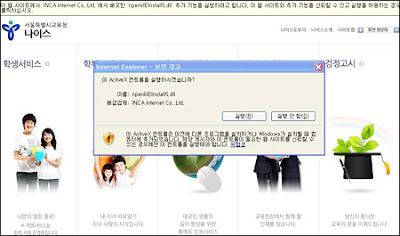나는 보통 직역은 안하는데 오늘 내 친구가 공유한 글에 매우 공감한바 여기서 간단히 소개한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너무 많은것에 집착을 하는데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포기해야할 것 15가지에 대한 글이다.
1. 내가 항상 옳아야 된다는 생각: 우리는 나는 항상 옳고 남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되길 바란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 자체가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된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만약에 상대방이 틀렸다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가?” 옳고 틀렸다는건 상대적이다.
2. 내가 항상 주도권을 가져야할 필요: 내 주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것들이 무엇이든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어라.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3. 남을 탓하는 습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남을 탓하지 말아라. 남들이 뭘 하든간에.
4. 스스로를 자책하는 습관: 자신을 사랑해라. 스스로에게 너무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는 없다.
5. 스스로의 한계를 정할 필요: 이 세상에 불가능한것은 없다. 일부러 불가능과 한계를 정할 필요는 없다. 일단 해보고 판단해라.
6. 불평하는 습관: 스스로를 불행하고, 슬프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습관을 포기해라. 내가 그렇다고 정의하기 전에는 인생의 그 어떤것도, 그 누구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7. 남을 비난하는 습관: 남들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아라. 그냥 다르다는걸 인정하고 편안하게 살아라.
8. 남한테 항상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 필요는 없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그만 둘때, 모든 가면을 벗을때, 진정한 나를 받아드릴때, 그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9. 변화에 대한 거부: 변화는 좋은 것이다. 변화는 나 자신과 내 주위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환영해라.변화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온통 벽으로만 느껴지던 주변 세상이 열릴 것이다.
10. 남을 규정하는 습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마음대로 규정하지 말아라. 이들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11. 두려움: 두려움을 버려라.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허상일 뿐이다.
12. 변명: 변명은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스스로를 발전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대신 우리는 수많은 변명거리를 만들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변명의 99.9%는 거짓이다.
13. 과거: 과거를 포기하는거…이거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과거는 현재보다 아름답고 미래는 무섭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있는 순간은 바로 현재 이 순간 밖에 없다. 그렇게 포기하기 힘든 과거가 현재였을때 우린 최선을 다했는가?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즐겨라. 어차피 인생은 목적지가 없는 짧은(or 긴) 여행이니까.
14. 애착: 과감히 포기해라. 애착을 포기하는게 가장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하지만 노력하면 포기할 수 있고 시간이 갈수록 좋아진다. 애착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면 진정한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
15. 남을 위한 삶을 사는 인생: 남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시키고 남들이 원하는대로 살고 있다.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 정부, 언론이 시키는대로 삶을 살고 있다. 남을 위한 삶을 살면서 내부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권을 상실하고 죽을때 많은 후회를 한다.
AMEN!
출처:
–“15 Things You Should Give Up To Be Happy” by World Observer 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