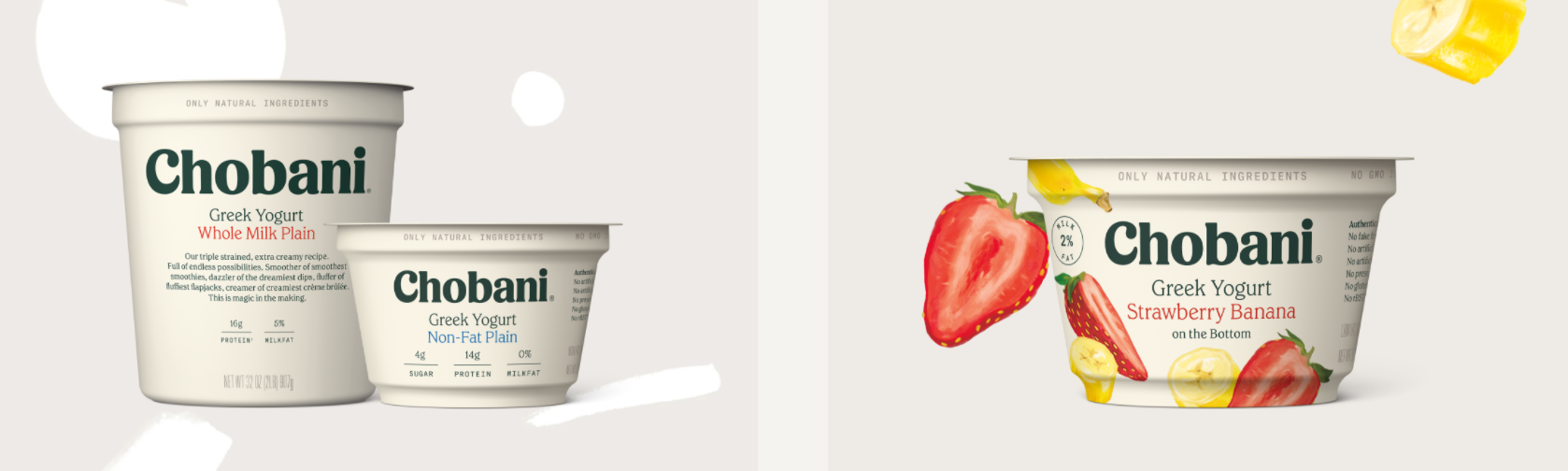영어에는 이런 말이 있다 “Ask forgiveness, not permission”
영어에는 이런 말이 있다 “Ask forgiveness, not permission”
이 말을 직역하면 “허락보다는 용서를 구해라”가 되는데 스타트업에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새로운 일을 벌일 때 – 특히, 벤처기업이라면 과거 전례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일 가능성이 높다 –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고민하는 것 보다는 일단 시작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해결하라는 의미다(해결책은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 내포)
얼마 전에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한 젊은 창업가를 만났다(프라이버시와 서비스의 비밀유지를 위해서 신상 비공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과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확실치 않았고, 자문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베타 사이트를 launch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서비스를 시작도 하지 못했고,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그 어떠한 수치와 시장의 피드백도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일단 서비스를 launch 하라고 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용서를 구하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젊은 친구는 평생 시작을 못 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시장의 허락을 구한다면 – 내가 장담하건대 – 절대로 허락받지 못한다. 사람과 시장의 심리라는 게 전례 없는 것들은 일단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10명한테 똑같은 거에 대해 상의하면 각각 다른 말을 할 것이다. 어떤 전문가는 괜찮다고 할 것이고, 어떤 전문가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것이다. 새로워서 아무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존 시장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예측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 100% 허락을 받고 시작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답은 –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이걸 할 의지가 있다면 – 그냥 하는 거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고 혹시 잘못되면 그때 가서 용서를 빌면 된다. 실제 우리 주위에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매우 많고 대표적인 사례들이 Uber, Airbnb와 Aereo다.
Uber는 지금 한국에서도 법적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다. 과거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교통수단 이어서 – 실제로 Uber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택시 운전사들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마켓플레이스지만 – 과연 이게 합법이니 불법이니 말들이 많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비즈니스는 잘 운영되고 돈도 잘 벌고 있다. 법적 문제와 교통 당국과 계속 충돌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잘 네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로비스트들을 활용해서 대부분 잘 합의해서 서비스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Airbnb도 마찬가지이다. 회사가 잘 되고 규모가 커지니까 숙박업소들이 이 비즈니스는 불법이라고 뉴욕에서는 소송까지 걸었다. 아마도 잘 합의 할 것이다(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합의할 것이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에어비앤비 고객이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서비스를 닫아버리면 시장의 반대는 절대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는 Uber도 마찬가지다.
Aereo에 대해서는 내가 과거에 포스팅한 적이 있다.
-Disrupt to Create
-The Disruptors
이 회사 또한 지금 방송사들과 법정 공방이 치열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기고 있다. 져도 분명히 합의해서 비즈니스 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Uber, Airbnb와 Aereo가 만약에 시장과 당국의 허락을 받은 후에 시작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창업하지 못했을 것이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비즈니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대부분(이 분야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들) 반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일단 시작했고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의 용서를 구하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
음악 산업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내가 뮤직쉐이크를 하면서 큰 음반사들과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음반사 법무팀과도 자주 일을 했다. 그중 한 변호사가 나한테 하루는 굉장히 긴 명단을 보여줬는데 아마도 거기에는 수 천개의 이름들이 있었다. 뭐냐고 물어보니, “우리 회사 음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리스트야. 너무 많아서 다 고소하는 것도 비효율적인데 이 중 엄청나게 커지거나 유명해지면 그때 소송을 걸려고.” 소송 걸었을 때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니, “냅스터같이 회사 문을 아예 닫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거지.”라고 했다.
시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서비스 시작을 했는데 어차피 서비스가 커지지 않으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없어지면 된다. 만약 대박이 터지면 그때 용서를 구하면 된다. 생각해보면 이건 굳이 벤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생에도 적용된다(그렇다고 범법행위를 한 후에 용서를 구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cbsnews.com/news/google-struggles-with-its-do-first-ask-forgiveness-later-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