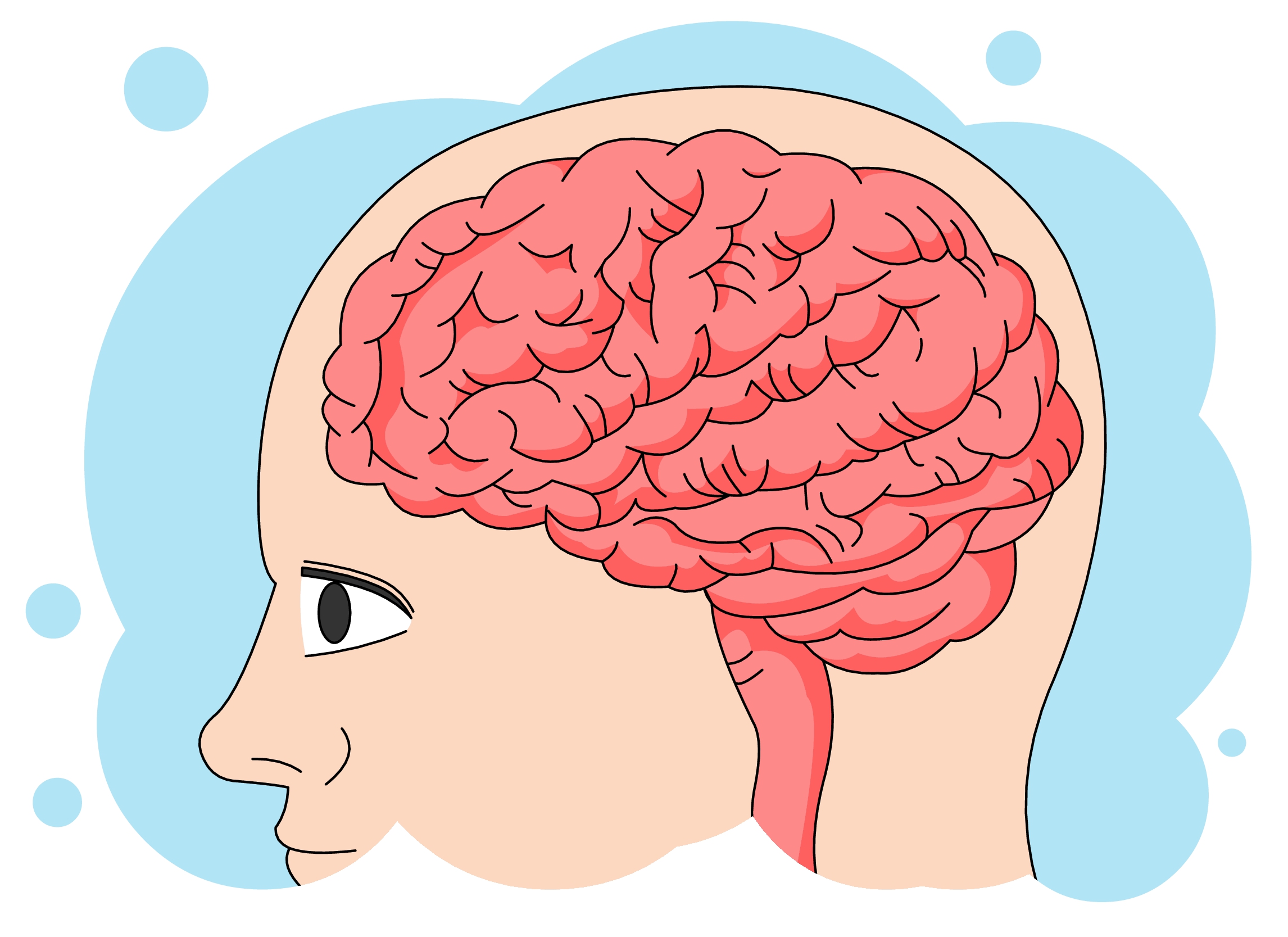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피트니스 클럽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고, 많은 헬스클럽이 문을 닫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피트니스 체인 중 하나인 24 Hour Fitness도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고, 아직 망하지 않은 헬스클럽은 PT 수업을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하거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비대면 PT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어떤 헬스클럽은 아예 운동기구를 대여하거나 판매해서 계속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Peloton이나 SoulCycle과 같은 사이클/스피닝 클래스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이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피트니스 클럽은 자전거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참 살벌한 세상이다. 살기 위한 이런 처절한 몸부림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다. 하지만, 살기 위한 이 투쟁의 다른 면을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회사의 경영진이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고, 마지막 한 방울 창의력까지 머리에서 쥐어짜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 많이 돌아다녀서 이걸 본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digital transformation을 오랫동안 주장했지만, 수 십년 동안 그 누구도 이걸 못 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한 방에 digital transformation이 시작된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고, 온라인 수업하는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이 동의하겠지만, 학교야말로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미래를 보여줘야 하는데, 실은 내가 아는 한국의 학교는 기술적으로 가장 낙후됐고, 신기술 도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대표적인 기관이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면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수적인 학교의 교무진과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하는 걸 보면, 코로나바이러스의 위력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우리도 비슷한걸 느끼고 있다. 팀이 한국과 미국에 있고, 두 지역에 투자를 하니, 화상 미팅은 항상 자주 해왔었고, 나도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직접 만나서 미팅하는걸 선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면 직접 얼굴 보고 만나는 미팅을 했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강제적으로 모든 미팅을 화상으로 진행했는데, 처음엔 좀 불편했지만, 이젠 오히려 이게 더 익숙해졌고, 왜 그동안 굳이 직접 만나서 미팅을 했을까 하는 의문까지 하는걸 보면, 나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변화했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변화가 만들어진 거 같다.
이런 살아남기 위한 변화는 규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은 원격의료가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는데, 어쩌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강제적으로 합법화되거나, 아니면 합법화되어가는 과정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품어 본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연구개발, 그리고 임상시험 과정 또한 기존 신약 연구개발 및 임상 과정보단 더 빨리 진행되는 걸 보면, 이게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 그동안 이해하기 힘든 법과 규제 때문에 불법이었던, 집으로 찾아오는 이발/미용 서비스도 합법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의 진화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사용자들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 장소를 직접 찾아갔다. 그 이후에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 주로 집 – 찾아왔다. 아마도 이 다음 단계는 사용자들이 비접촉 방식으로, 원격으로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미래가 한 5년~10년 뒤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는 한 방에 이런 미래를 더 우리에게 가깝게 오게 했다.
물론, 이 사태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코로나바이러스 이전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안전하게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살기 위한 변화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