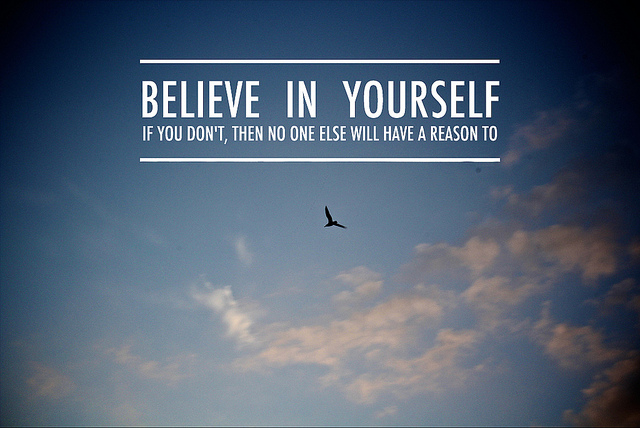몇 달 전에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탈 ‘민원24‘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을 사용해 볼 기회가 있었다. 한국 정부의 IT 수준을 대략 아는 일인으로써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 일 처리는 못하고 한 시간 동안 그냥 열만 받다 브라우저를 닫았다.
한 시간 내내 민원 사이트에서 내가 한 거라고는 끝없는 액티브 엑스 설치와 같은 정보 입력이었다(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주 길고 복잡한 양식을 채운 후 [확인]을 눌렀을 때 액티브 엑스가 안 깔려서 설치하면 다시 그 양식을 처음부터 채워 넣어야 한다). 한국 사이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나였지만,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과 액티브 엑스를 깔아본 적이 있을까? 심지어 민원 사이트에는 ‘민원24 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 목록‘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 윈도우스 사용자라면 – 18개의 프로그램이 나열되어 있다.
사이트 하나 이용하는데 18개의 프로그램 설치라…. 짜증이 엄청났지만 이미 30분 이상을 여기에 낭비했고,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깔고, 반복하고, 다시 깔고, 생쇼를 했다. 모든 관문을 다 통과했고, 기재한 양식을 출력할 시점에 알아낸 놀라운 사실 – 출력하기 위해서 무슨 보안 모듈을 설치해야 하고 아무 프린터에서나 출력을 못 한다는. 이 시점에서 나는 브라우저를 닫았다. 그리고 한 5분 동안 쌍욕을 했다. 또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중앙행정부의 시스템이랑 서울시의 시스템과는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온라인으로 처리하려던 케이스는 어차피 출력해서 직접 담당 부서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점에 나는 미국의 정부 사이트 (FDA)에 몇 가지 제품을 등록했다. UI로 따지면 미국 정부 사이트는 한국 정부 사이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하고 저렴하다. 이미지는 없고 거의 텍스트 기반이다. 하지만, 지저분한 액티브 엑스는 전혀 깔지 않아도 되고 인증서 기반의 로그인도 필요 없다. 물론 인증서가 좋냐 안 좋으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나는 인증서 폐기에 동의하는 일인이다. FDA 사이트는 굉장히 메마르고 이미지 하나 없었지만,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했고 나는 15분 만에 제품을 등록할 수 있었다. UI는 한국 정부 사이트보다 많이 뒤질지 모르지만, UX는 쓸만했다.
전자정부를 설계하고 정책을 만든 사람들한테 묻고 싶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만들어 놓고 사용은 해봤는지.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봤다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인지 깨닫고 뭔가 개선책을 만들 법도 한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거 같다. 아니면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신흥 시장 (Emerging Market)”이라는 용어의 창시자이자 경제학자/투자자인 Antoine van Agtmael이 작년에 중국을 방문했을때 지난 40년 동안 아시아를 연구하면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한명이 아닌 여러명의 중국 제조업체 사장들이 ‘미국의 제조 경쟁력’이 신경쓰인다고 했던 것이다.
“신흥 시장 (Emerging Market)”이라는 용어의 창시자이자 경제학자/투자자인 Antoine van Agtmael이 작년에 중국을 방문했을때 지난 40년 동안 아시아를 연구하면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한명이 아닌 여러명의 중국 제조업체 사장들이 ‘미국의 제조 경쟁력’이 신경쓰인다고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