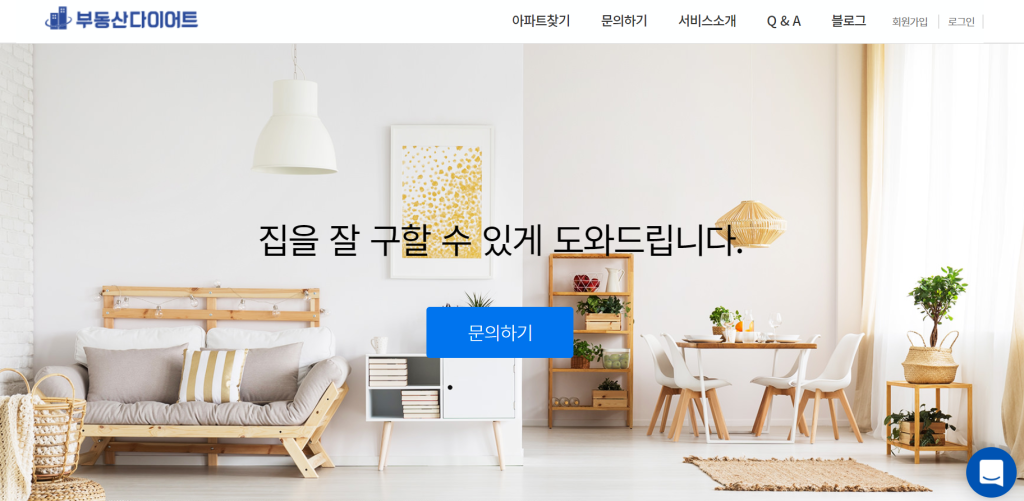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회사가 됐거나, 남아 있어도 공룡의 이미지로 남아있는 거 같다. 나는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장래가 밝다고 생각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보다 오히려 사회에 더 큰 긍정적인 공헌을 하는 회사라고 믿는다. 실은, 이런 좋은 느낌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보다는 43년 전에 이 회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에 대한 존경과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했지만, 그동안 빌 게이츠 회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었고, 운 좋게도 직접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는데, 비즈니스를 떠나서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분을 좋아하게 됐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이상한 결정도 했고, 힘을 이용해 약자를 완전히 뭉개버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인류에 큰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빌 게이츠는 이제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서 Bill & Melinda Gates 재단을 통해서 세계 빈곤과 질병과 싸우고 있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 재단의 2018년도 연례편지에 빌과 멜린다 재단에 대해 사람들이 물어보는 가장 어려운 10가지 질문과 답이 실렸는데, 여기서는 질문만 일단 소개해본다:
1/ 왜 미국에는 더 기부하지 않나요? (Why don’t you give more in the United States?)
2/ 미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나요? (What do you have to show for the billions you’ve spent on U.S. education?)
3/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왜 기부하지 않나요? (Why don’t you give money to fight climate change?)
4/ 두 분의 개인적인 가치를 다른 문화에 강요하는 건 아닌가요? (Are you imposing your values on other cultures?)
5/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면 오히려 인구과잉이 발생하지 않나요? (Does saving kids’ lives lead to overpopulation?)
6/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재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How are President Trump’s policies affecting your foundation’s work?)
7/ 기업들과 왜 협업하나요? (Why do you work with corporations?)
8/ 재단의 영향이 너무 센 거 아닌가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Is it fair that you have so much influence?)
9/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What happens when the two of you disagree?)
10/ 개인 돈을 굳이 왜 기부하나요? 개인적으로 얻는 게 뭐가 있나요? (Why are you really giving your money away – what’s in it for you?)
좀 길지만, 영어 공부하는 셈 치고라도 한 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는 걸 권장하고 싶다. 가식적이지 않고, 솔직 담백하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의견도 소신 있어서 좋고, 지금까지 재단이 잘 못 한 점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내용도 좋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곳에 집중 투자 – 교육 투자도 다른 분야보다는 고등학교 교육에 집중 투자 – 하는 전략은 대기업 경영 경험이 없으면 할 수 없기에 더 멋진 거 같다.
마지막 질문은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자수성가해서 이룬 부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한테 나도 항상 하고 싶은 질문이다. 의미 있는 일이고, 스스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한다는 빌 게이츠의 답변에서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생각을 했다. 재미도 있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건 참 쉽지 않은데,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재단도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누구나 젊을 땐 열심히 일하지만, 나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주 열심히 일했다. 결국은 빌 게이츠를 부자로 만들어 준 거라서 당시엔 좀 씁쓸했지만,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로 번 100조 원 이상의 돈 중 99%를 살아 있을 때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준거라서 기분이 썩 나쁘진 않다.
빌 게이츠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다 쓰고, 그리고 가난하게 죽는 건 아주 좋은 거 같다. 노벨 평화상은 빌 게이츠가 받아야 한다고 한 내 트친이 있었는데, 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