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고 햄버거는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그런데 미국인들한테 김치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 질문은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 벤처인들의 질문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이 창업했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시키는건 마치 미국인들에게 김치를 판매하는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고 햄버거는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그런데 미국인들한테 김치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 질문은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 벤처인들의 질문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이 창업했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시키는건 마치 미국인들에게 김치를 판매하는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도 그 정답은 모른다. 태생이 한국인 제품 뮤직쉐이크를 미국 시장으로 진출시키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고 잘 한 부분도 있지만,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고는 못 하겠다. 실은, 뮤직쉐이크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품에만 국한해서 보면 그 어떤 한국의 스타트업도 미국에 진출해서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아직) 없다. 미국에서 김치를 판매하는건 무리인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게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스트롱벤처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는 3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1. 김치말고 햄버거를 팔아라 – 과연 미국인들이 김치를 먹을까? 이 시각의 전제는 ‘미국인들은 김치를 먹지 않는다’ 이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한테는 김치가 아닌 햄버거를 팔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평생 김치만 먹고, 김치만 만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햄버거를 만들 수는 없다. 레시피를 보고 대충 흉내 낼 수는 있겠지만, 햄버거 맛을 잘 아는 양놈들이 이런 엉터리 버거를 돈내고 사먹을리 없다. 한국에서 개발된 제품을 대충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전략이 바로 이런 엉터리 햄버거를 미국에서 판매하는 거와 비슷하다. 제대로된 햄버거를 만들려면 햄버거를 이미 만들어 본 요리사를 새로 영입해야 하는데, 미국 시장용 제품을 만들고 싶으면 영어를 하고,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미국 문화를 아는 인력을 영입해야 하는 거와 같다.
2. 계속 김치를 팔아라 – 이 의견의 전제는 ‘미국인들도 김치를 먹는다.’ 이다. 상식적으로 평생 김치를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갑자기 햄버거를 만들어 팔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냥 잘 만들던 김치를 만들어서 계속 판매하는게 자연스러운 전략일수 있다.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분명히 미국인들도 먹을 것인데 다만 아직 미국 사람들은 김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마케팅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한다. 한국에서 너무나 인기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양놈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마케팅을 잘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과 비슷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일단 미국에 사는 교포들을 대상으로 김치를 판매하고, 이를 시작으로 서서히 메인스트림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김치를 백인들한테 성공적으로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느낀건 김치 자체가 모든 미국인들이 즐기기에는 너무나 한국적인 음식이라는 것이다.
3. 아메리칸 김치를 팔아라 – #1번과 #2번을 적절히 혼합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김치의 기본 재료와 ‘발효’라는 core 컨셉은 유지하되 양념과 맛을 미국 시장에 조금 더 적합하게 customize 하는 것이다. 덜 맵게 하거나, 냄새가 강한 마늘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또는 미국인들이 좋아하게 더 달게 만드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고 어떤게 가장 잘 먹히는지는 꾸준한 실험과 반복을 통해서 fit을 찾아야 한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성공한 제품이라면 그 기본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UI, 기능, 결제방법 등을 더 미국적으로 바꾸는 거와 비슷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product iteration을 하면서 market과 product fit을 찾아야 한다. 아메리칸 김치를 만드려면 한국의 오리지날 김치도 먹어보고 김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햄버거도 먹어보고 햄버거를 직접 만들어 본 요리사가 필요하다. 한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한국과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를 잘 알고, 양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아메리칸 김치’의 예에 가장 적절한 내가 아는 음식/식당 두개가 있다. 하나는 food truck 열풍을 시작한 Kogi 이다. 한국 교포 요리사 Roy Choi가 한국의 갈비, 파, 김치를 재료로 만든 멕시코의 대표 길거리 음식 타코인데 정말 맛있다. 지금은 유사품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몇 년 전과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Kogi 트럭이 오면 줄을 서서 먹어야 한다. 또다른 음식은 LA 우리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Seoul Sausage 이다. 한국인 2세 3 명이 경영하는 이 식당은 핫도그가 주 메뉴인데 한국의 갈비와 돼지갈비를 가지고 만든 소세지를 사용한다. 더 재미있는 건 이 식당에 가면 한국 음료인 ‘암바사’와 ‘쌕쌕’도 팔고, 튀긴 김치 주먹밥과 같은 다양한 코리안 퓨젼 음식들이 있다. 한국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는, 한국 컨셉의 음식을 팔지만, 고객의 대부분은 미국인들이다.
세상 모든일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정답은 없다. 어떤 회사들은 미국에서도 계속 김치를 팔면서 꾸준히 시장을 만들어 가고, 어떤 회사들은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햄버거를 팔면서 성공을 꿈꾸고 있다. 또는, 김치와 햄버거 경험을 두루 갖춘 인력을 기반으로 미국시장에 최적화된 ‘아메리칸 김치’를 만들어서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 회사의 제품, 인력, 방향, 전략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전략은 다를 것이고 이 전략 자체가 계속 바뀔수도 있다. 하지만, 전략과는 상관없이 아직 그 어떤 한국 소프트웨어 회사도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진 못했다. 나는 5년 안으로 할 수 있다는데 한 표를 걸어본다.
<이미지 출처 = http://pureglutton.com/bulgogi-brothers-stir-burger-rev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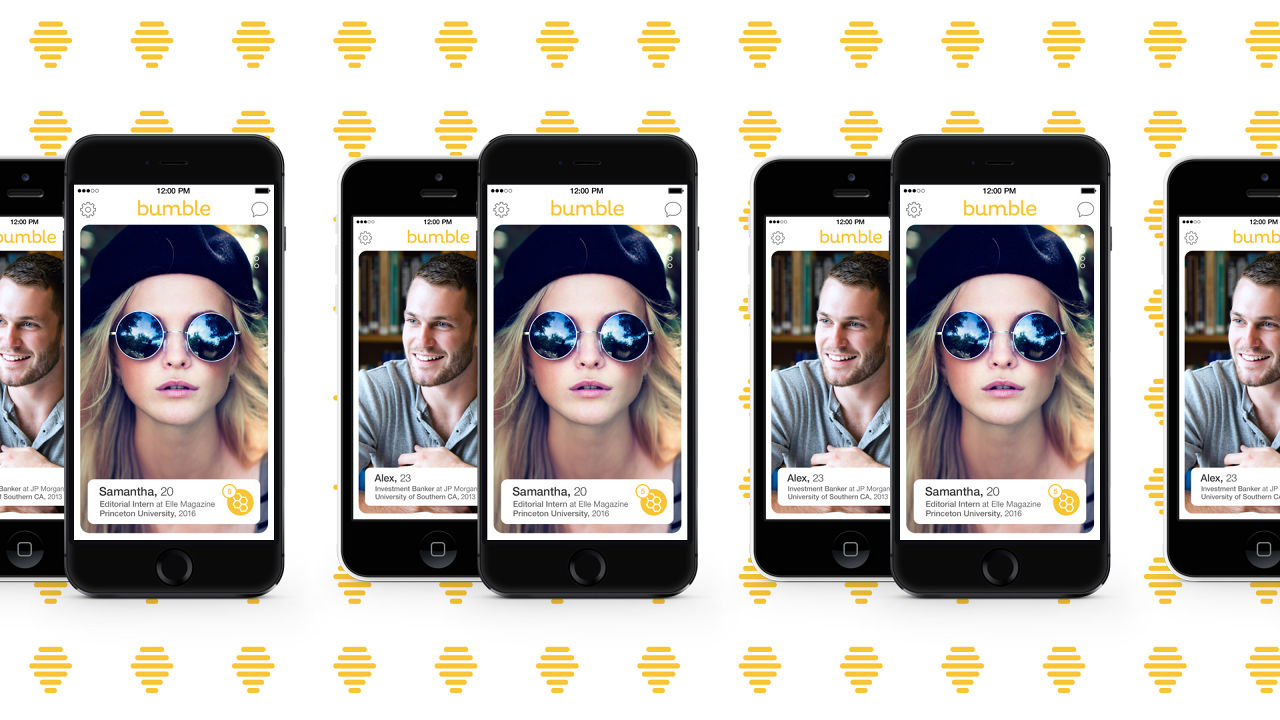
 인터넷 스트리밍/라디오 서비스 판도라 미디어가 지난 주에 2014년 3사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실적 자체는 월가의 예상을 넘었지만, 주가는 거의 20% 정도 하락했다. 뮤직쉐이크를 5년 정도 미국에서 운영하면서 존경 반, 부러움 반으로 벤치마킹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거의 매일 사용하고 듣는 서비스라서 – 주말에 실적 관련 자료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봤다.
인터넷 스트리밍/라디오 서비스 판도라 미디어가 지난 주에 2014년 3사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실적 자체는 월가의 예상을 넘었지만, 주가는 거의 20% 정도 하락했다. 뮤직쉐이크를 5년 정도 미국에서 운영하면서 존경 반, 부러움 반으로 벤치마킹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거의 매일 사용하고 듣는 서비스라서 – 주말에 실적 관련 자료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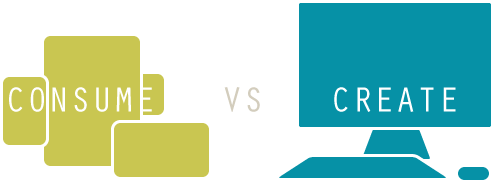 iPhone 6는 화면이 더 커진다는 믿을만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이는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다. 작은 화면을 가진 기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다.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화면상에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눈이 어지럽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동시에 사용할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간단하지 않은 서비스를 만드는 건 진짜로 어려운 지상과제이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가장 완성도가 높은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완성도도 높지만, 유일하게 중요한 스마트폰이다. 안드로이드폰들은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한다 – 화면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큰 장애물 하나가 낮아지는거라고 생각한다.
iPhone 6는 화면이 더 커진다는 믿을만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이는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다. 작은 화면을 가진 기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다.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화면상에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눈이 어지럽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동시에 사용할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간단하지 않은 서비스를 만드는 건 진짜로 어려운 지상과제이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가장 완성도가 높은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완성도도 높지만, 유일하게 중요한 스마트폰이다. 안드로이드폰들은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한다 – 화면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큰 장애물 하나가 낮아지는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