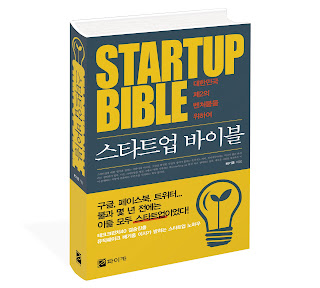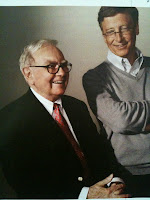나는 한 달에 책을 1~2권 정도 읽는다. 단순히 독자로서 책을 읽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재미있는 책, 재미없는 책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읽었는데 최근 약 1년 동안 출판사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출판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분야를 요새 조금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요새 출판업계의 화두는 ebook인 거 같다. 참고로, 미국과 유럽이 특히 그렇고 아직 한국은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 같다. 솔직히 전자책에 대한 말들과 전자책 device는 그다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1971년도에 Michael Hart는 Gutenberg Project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e-book 프로토타입을 대중에게 소개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저기서 작은 제조업체들이 ebook 기기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소개하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중은 종이의 냄새, 잉크의 냄새 그리고 물리적인 책을 만졌을 때의 그 뿌듯한 보람과 느낌을 잊지 못하고 책은 무조건 종이의 형태로 소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였다.
일반 소비자를 위한 첫 번째 ebook은 1990년대에 시장에 소개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휴대용 기기들이 마땅치 않아서 대중적인 인기도를 얻는 데 실패하였다. ebook을 읽을 수 있는 옵션은 투박한 컴퓨터 화면이나 아주 작은 핸드폰 화면만 있었기 때문이다. 2007년도에 Amazon이 Kindle을 시장에 소개하였다. 엄청난 콘텐츠를(Amazon.com의 책들) 기반으로 device를 파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Apple이 iTunes와 iPod를 가지고 음악 시장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각도에서 번들해서 파는 – 신개념의 device play를 그대로 재활용한 모델이었고 이때부터 ebook과 epublishing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0년도 4월 애플의 iPad 출시와 함께 ebook 시장은 말콤 글래드웰이 말하는 ‘tipping point’를 향해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Bold Predictions
8월 3일 Lake Tahoe에서 열렸던 Techonomy Conference에서 CNBC의 여성 앵커 Maria Bartiromo가 진행했던 패널에서 MIT Media Lab의 창시자이자 기술 전도사로 유명한 Nicholas Negroponte는 (그는 또한 “Being Digital: 디지털이다”이라는 책의 저자이다) 남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와중에 매우 대담한 예언을 하였다. 그는 앞으로 5년 뒤에는 종이로 만든 물리적인 책은 멸종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지만 이미 영화와 음악 산업의 전례를 보면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말을 하였다. 1980년대에 코닥과 같은 회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인하였지만, 많은 전문가는 물리적인 영화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예언을 하였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또한, 음반이나 CD 위주의 음악 산업이 이제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것도 좋은 예라고 하였다.
물론, ‘멸종’이라고 해서 종이책이 완전히 사라지는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의 대세는 ebook이 될 것이라는 뜻이며 그는 좋은 예로 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One Laptop per Child 프로젝트를 제공하였다. 이 저가의 노트북을 그는 수십만 권의 책을 디지털 포맷으로 채워서 제 3세계의 어린이들한테 보급할 수 있지만, 수십만 권의 책을 물리적으로 이 어린이들한테 선적해서 보내준다는 건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말을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no, no, no’ 라고 하겠죠. 아직도 서점이 좋고 도서관에 가서 책 냄새를 맡는 게 좋다고 하면서…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 변화의 물결을 부인하고 있는 바로 지금 변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 후가 아닙니다. 바로 5년 후에는 ebook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TechCrunch의 편집자들 또한 매우 충격적인 예언을 한다. 앞으로 5년 후에는 동네의 작은 서점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며, Barnes & Noble이나 Borders와 같은 대형 서점은 8년 후에 모두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한다. 더욱더 재미있는 사실은 2020년이 되면 모든 물리적인 도서관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때가 되면 CD나 레코드판이 우리의 기억 저편에 위치한 까마득한 추억이 된 것처럼, 종이책들은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유물이 될 것이라고 한다.
TechCrunch에서 인터뷰한 이미 ebook을 출판하고 있는 많은 작가는 ebook에 대해 좋지 않은 의견들과 불평들은 다 근거가 없다고 한다. 종이 책들이 냄새가 더 좋고, 이쁘고…그리고 ebook을 읽으면 눈이 나빠진다니 하는 이 모든 게 사실무근이라고 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책을 많이 사지 않는 사람들이며, 이미 지금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책 중 10%가 ebook이라고 한다.
버클리 대학교 주변에서 꽤 크고 성공적인 동네 책방을 운영하던 – 2008년도에 Barnes & Noble 때문에 결국 책방을 닫았던 – Andy Ross씨의 말을 빌리자면, “요새 출판업계에서 매일매일 들리는 말은 ebook밖에 없습니다. 저는 음악 산업과 비슷한 그림이 그려질 거 같아요. ebook이 표준이 될 날이 곧 올 것이며, 구텐버그의 500년 종이 역사는 그때 끝날 겁니다.”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종이책과 물리적인 서점의 장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동네 책방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 서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e-Reading
그런데 정말로 이런 예언들이 맞는 것일까? 물론, 음반 시장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순탄치 않은 길을 하나씩 짚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다 더 빨리 ebook이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책이라는 게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소장가치 면에서도 정신적으로 큰 기쁨을 주는 물건이 아닌가? 이제 더이상 책으로 가득 찬 서재를 친구들과 가족들한테 자랑하면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우울한 상상인가? 그 대신 아이패드의 전자도서관을 보여줘야 하는 것일까? 이 힘들고 복잡한 질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e-reading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
최근에 1,200명의 ebook 기기 사용자들을 (Amazon의 Kindle, Apple의 iPad 그리고 Sony의 Reader의 사용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중 40%가 종이책만 읽을 때보다 ebook 기기를 가지면 독서를 더 많이 한다고 한 적이 있다. 올해 9월 말까지 약 1,100만 명의 미국인들이 ebook 기기를 소유할 것이라고 Forrester Research에서 예측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에 미국에서의 ebook 매출은 약 183%나 성장하였다. 이미 아마존에서는 전자책 판매가 물리적인 책의 판매를 뛰어넘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으며, Kindle을 구매한 고객들은 그전보다 3.3배나 많은 양의 책을 구매한다는 수치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적이 있다.
매우 놀라운 숫자들이지만, 과연 Kindle과 iPad와 같은 기기들의 신선도가 떨어진 다음에도 e-reading이 이러한 성장을 해서 대중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을지는 현재 미지수이다. 하지만, 항상 휴대할 수 있다는 – 물리적인 책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 큰 차이점을 생각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e-reading이 대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현재 내 iPad에 30권 정도의 책을 소유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탈 때 30권의 종이책을 들고 탈 수는 없다.
또한, 전통적인 인쇄 기계에 의존하는 종이책과는 달리 최첨단 기술의 지원을 받는 ebook은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수동적인 독서에 뭔가 다른 차원의 interactivity를 가미한다. 아동 독서 작가인 Lynley Dodd씨는 “Hairy Maclary”라는 시리즈물에서 한 권의 책을 iPad App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다. 이 앱을 사용하면 부모님이나 애들이 책을 직접 읽는 걸 녹음할 수가 있고, 책을 보면서 동화책의 삽화를 직접 색칠할 수도 있다. ebook 기기는 또한, 두 손이 아닌 한 손으로 책장을 넘길 수 있으며, 아이패드와 같은 기기는 손가락으로 글씨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침대에서 불을 끈 상태에서도 기기의 백라이트를 이용해서 어둠 속에서도 독서가 가능하며 책을 구매하기 전에 무료 샘플을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는 전통적인 종이책이 제공하지 못하는 장점들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종이책만의 장점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DRM과 보안 기술 때문에 우리는 좋은 책들을 친구와 가족들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는 미덕을 ebook을 통해서는 누릴 수가 없다. 또한, 비행기 이/착륙하는 기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꺼야 하기 때문에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종이책을 읽을 수 있는 동안에 독서의 즐거움을 당분간 접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여기 Wall Street Journal에서 제시하는 e-reading 관련 재미있는 숫자들을 몇개 소개한다:
- 지난 1년동안 ebook 기기 소유자들의 51%가 그 전보다 전자책을 더 많이 구매함 (종이책은 9%)
- ebook 기기로 한달에 읽는 독서량은 2.6권 (종이책은 1.9권)
- 2008년 대비 2009년도 미국 종이책 판매량은 1.8% 감소
- 2009년 미국에서의 ebook 판매량은 176% 증가
- ebook 기기 소유자들의 51%가 매일 ebook 기기로 독서를 함
- ebook 기기 소유자들의 86%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ebook 기기로 독서를 함
Books vs. E-Books
그러면 일반적인 종이책과 전자책을 조금 더 자세히 항목당 한 번 비교해보자:
1. 생산비용 – $4.05 ($26짜리 종이책) vs. $0.50 ($9.99 전자책 다운로드)
2. 작가한테 떨어지는 원고료 – $3.90 (종이책 한 권당) vs. $2.12 (다운로드 한 건당)
3. 무게 (같은 책 기준) – 1kg 종이책 vs. 0.01kg 킨들 ebook 기기
4. 탄소 배출량 – 50권의 종이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탄소 배출량과 1개의 ebook 기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탄소 배출량이 동일 (아직은 종이책이 조금 더 green 한 선택)
5. 2009년도 매출 – $2억5천만 (종이책) vs. $2,900만 (ebook 다운로드)
6. Jane Austen의 “Seven Novels” 가격 – $12.99 (종이책) vs. 공짜 (Kindle Version)
500년 동안 존재하던 종이책과 이제 갓 시작하는 전자책을 이렇게 개별로 비교하는 게 조금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서로 장단점이 존재하는 거 같다. 물리적인 종이책을 손에 쥐는 뿌듯함과 진열대에 배치된 책을 보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건 ebook을 통해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정신적인 즐거움이며,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책을 서로 빌려보는 공유의 미덕 또한 종이책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재미이다. 하지만, ebook의 상대적인 저렴함, 휴대성 그리고 날이 갈수록 발달하는 전자책 관련 기술들 또한 ebook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The Future of eBooks
그러면 ebook의 미래에 대한 내 생각은? 음…솔직히 출판업의 “출”과 “판” 자도 모르는 내가 감히 이런 예측을 하는 게 조금 우습지만, 지금까지 내가 꼼꼼하게 읽고 느낀 점들을 종합해서 몇 마디 할 수 있다면 나도 ebook에 큰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1998년도에 대박 히트한 Meg Ryan 주연 “You’ve Got Mail” 이라는 영화에서 맥 라이언이 운영하는 작은 책방이 대형 체인 서점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걸 우리는 목격했다. 1980년대에 큰 성장과 수익을 누릴 수 있었던 이러한 대형 서점들은 불과 10년도 채 되지 못해서 Amazon과 같은 인터넷 책방으로부터 시장을 빼앗기기 시작하였으며, 700개 이상의 물리적인 서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서점 체인인 Barnes & Noble은 8월 초에 시장에 매물로 나와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참고로, Barnes & Noble은 현재 아주 추잡한 적대적 인수의 싸움에 휘말려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게 700개 이상의 건물에서 책 장사를 하는 Barnes & Noble의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원밖에 안된다는 거였다. 참고로, Amazon의 시가총액은 무려 70조 원이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12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Oxford Dictionary를 이제 더 종이책으로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며칠 전에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연간 $295를 내면 온라인 사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비해서 옥스포드 사전을 책으로 마련하면 20권짜리 사전이 무려 $1,165이라고 한다. 1989년도에 출판된 버전은 21년 동안 30,000권밖에 팔리지 않았지만, 옥스포드 사전 온라인 서비스는 매달 2백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
세계 최대의 서점이 되어버린 Amazon에서 3년 전에 Kindle을 출시하였는데 3년 만에 이미 종이책보다 더 많은 수의 Kindle 버전의 전자책을 판다고 Jeff Bezos가 발표한 적이 있으며, 올해 안으로 종이책보다 Kindle용 ebook을 더 많이 팔 것이라는 예측을 그는 공식적으로 하였다. 여기에 6개월도 안 되어서 이미 3백만 개가 넘게 팔린 Apple의 iPad와 Google이 곧 출시할 eBook Store를 고려해보면 구텐버그가 지하에서 대성통곡할 만도 하다. 확실히 출판업계에도 기술이 미치는 지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되며, 이 바닥에서는 피튀기는 싸움이 벌어지겠지만 모든 게 그렇듯이 이러한 싸움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매할 수 있고, 굳이 차를 몰고 책방에 가지 않고 그냥 원 클릭으로 구매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는 혜택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다. Kindle보다 역사는 짧지만 나도 얼마 전에 산 애플의 iPad는 e-reading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바로 컬러 독서를 가능케 하고 있다.
앞서 말한 Barnes & Noble과 아마존의 시가총액: 1조3천억원 vs. 70조원 – 바로 기술을 이용한 유통의 경제성과 ebook이 지배할 세상에서의 종이책의 암담한 미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들이다. 책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말도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 객관적인 data를 그렇게 부인할 수도 없을 것이다. 과연 ebook의 시대가 올까 말까는 논의조차 하지 말자. 그건 기정사실이다. 이미 그 혁명은 시작되었다. 우리가 진짜로 물어보고 출판업자들이 걱정해야 하는 건 과연 언제일까이다.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1년 후?
아직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 레코드 공업협회에서 따온 자료를 소개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음악 시장인 미국의 경우, 현재 디지털 음악의 매출은 전체 미국 음악 시장의 40%를 차지한다. 0%에서 40%까지 되는데 소요된 기간은 단지 8년이었다.”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