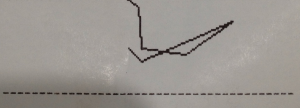최근 3년간 한국에 여러 번 출장 다니면서 의아하기도 하고 짜증도 났던 신용카드 서명 관련된 이야기다. 과거에는 실제 신용카드 전표에 펜으로 서명을 했지만 이제는 모두 기계로 바뀌면서 스타일러스 펜으로 기기의 화면에 서명을 한다. 그런데 미국과 약간 다름점이 있다면 미국의 경우 서명을 한 후에 누르는 ‘확인’ 버튼이 서명을 하는 기기에 있어서 신용카드 소비자가 누르게 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서명하는 기기에 ‘확인’ 버튼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일부러 봤는데, 내가 갔던 식당이나 가게는 거의 이랬다). 대신 이 ‘확인’은 카운터에 있는 분이 알아서 누르게 되어 있다.
난 서명이 좀 길고 복잡해서 그냥 대충 동그라미나 줄 한두게 긎는 사람들보다는 서명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린다. 그런데 서명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카운터에서 그냥 ‘확인’을 눌러버려서 반쪽짜리 서명으로 신용카드가 결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솔직히 이건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주인이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 카드사용을 승인하지 않은거랑 동일 – 가게에서 승인을 해버리는거랑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막말로 내가 나중에 이 가게에 와서 이거 내 서명이랑 다르고, 내가 서명한게 아니라고 따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몇몇 가게 주인들한테는 이렇게 따져봤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 커녕 다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서 “손님 서명이 너무 길어요 ㅎ”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분명히 신용카드 뒷면을 보면 카드주인이 서명하는 란이 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 카드는 상기란에 서명된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있다. 미국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카드 뒷면의 서명과 실제 서명을 비교해보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신분증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의 경우 이런 적은 한번도 없었다.
문화 차이인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해보자. 도둑놈이 내 신용카드를 막 긁고 다니면서 내 서명이 아닌 다른 서명을 하는데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금융사기와 신용카드 정보유출 관련 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요새는.
더 재미있는 건, 어떤 커피샾에서 계산하면서 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카운터 알바생이 나 대신 그냥 다음과 같이 지가 서명하고 내 신용카드 승인을 해준 경우가 있었다. 뭐라 하니까 “원래 다 그렇게 해요”라는 성의없는 답변만 돌아왔고 그 알바생은 그날 나한테 험한 말 좀 들었다.
이런건 원래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아닌가? 내가 너무 까칠한건가? 이런 생각을 아무도 해보지 않은건지 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