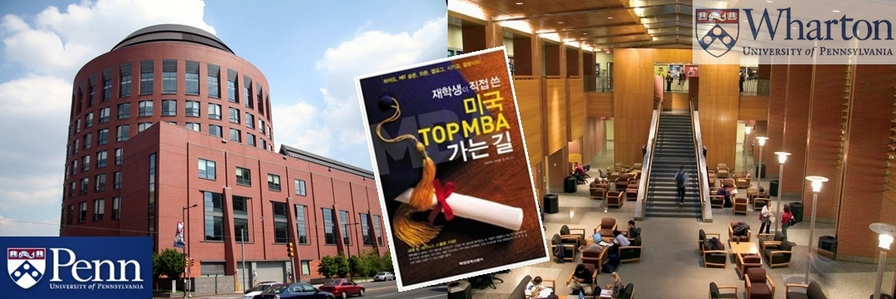내가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내 개인적인 생각과 설명이다. 내가 쓰는 글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어떤 분들은 동의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인데 내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얼마전에도 이 질문을 받았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2년 전에 미국에 처음와서 MBA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제 곧 졸업인데 저 같은 한국 토종도 미국 VC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일단…매우 애매하고 사람마다 다른 그런 질문이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라서 나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다. 아주 간단하게 풀어보면 나는 VC 들은 기본적으로 다음 능력/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돈 – 이건 당연하다. 투자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투자자라고 볼 수 없다.
- 어느정도의 경험 – 스타트업 관련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여러가지 일 수 있는데 창업 후 성공적인 exit 경험,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창업 후 여러가지 벤처 시나리오 경험, 직접 창업은 하지 않았지만 스타트업 경험, 직접 창업하거나 스타트업에서 일해보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동안 여러 스타트업들에 투자해서 이들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 정도라고 생각한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창업가들이랑 도저히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창업가들이 투자자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내 주위에는 전혀 스타트업 경험은 없지만 투자하는 회사마다 대박이 나는 능력자들도 가끔 있다.
- Deal sourcing 능력 – VC 업계에도 최근들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VC로써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이 deal sourcing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돈만 있으면 창업가들이 줄을 서서 투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 좋은 창업가가 있다면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창업가는 입맛에 따라 골라서 돈을 받을 수 있다. Deal sourcing을 잘하는 VC들은 내 생각에 2 부류가 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젊고 경험이 없는 VC들인데 이들이 잘하는 건 발로 열심히 뛰어 다니는 거다. Facebook을 처음 발견한 Kevin Efrusy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참고로 Efrusy씨는 이제 실리콘 밸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물 VC가 되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면서 마치 영업사원처럼 좋은 창업가와 회사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견하고 이들에게 스스로를 잘 팔아서 창업가들이 남의 돈이 아닌 내 돈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 다른 부류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있고 경험이 많은 VC들인데 이미 투자자로써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했고 그동안 좋은 connection을 – 다른 투자자 및 창업가들과 –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유망주들에 대한 소식을 남들보다 먼저 접하게 된다. 참고로, deal sourcing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남들이 잘 모르는 회사들을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을때 더 좋은 조건에 남들보다 먼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로써 대박은 바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럼 한국에서 온 분들이 미국에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VC를 하려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중요하며 기본적인 건 영어다. 첫째도 영어, 둘째도 영어, 그리고 셋째도 유창한 영어다. 위에서 언급한 능력들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자. 재벌가 출신이 아닌 이상 투자를 하기 위한 돈 또한 외부에서 받아야 한다. 영어를 못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 자신을 어필하고 수십억원의 돈을 받을 수 있나? 스타트업 경험을 쌓으려면 창업을 하거나 스타트업들과 아주 헤비하게 involve가 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영어가 안되면 택도 없다. 한국에서의 경험? 솔직히 요새 소위 말하는 unicorn 경험 또는 그와 비슷한게 아닌 이상 별로 안 쳐준다.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데 남들보다 먼저 deal sourcing은 어떻게 하나? 일단 어느 지역에 어떤 회사들이 요새 뜨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파악을 하더라도 그 회사의 창업팀을 찾아가서 “나,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당신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그리고 내가 유능한 미국 창업가라면 영어를 띄엄띄엄하는 투자자한테는 왠만하면 돈을 안 받을 거 같다. 능력있고 자신있는 창업가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많은데 굳이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우리 회사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것이다.
유창한 영어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비즈니스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필수 요소이다.
*관련 동영상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VC 되기” 보기
*영어 관련 과거 포스팅:
–영어 하기
–Do You Speak English? – Part 1
–Do You Speak English? – Part 2
 한동안 work and life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았는데 – 우리 와이프는 절대 동의 못함 – 올 초부터 다시 work, work, work 생활이 된 거 같다. 솔직히 요샌 너무 빨리 인생을 달려서 잠시 앉아서 생각을 못 한다. 얼마전에 일부러 시간을 좀 내서 곰곰히 생각해 봤다. 내가 정말 그렇게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걸까 아니면 가만히 아무것도 안하고 생각을 하면 뭔가 불안해서 계속 빨리 빨리 움직이는 걸까. 역시 후자다. 크게 생각해보면 인생 뭐 그렇게 바쁘게 살 필요 없다. 이메일 당장 답변하지 않아도 큰 일 나지 않고 투자 계약서 지금 당장 검토하지 않아도 투자에 큰 지장은 없다.
한동안 work and life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았는데 – 우리 와이프는 절대 동의 못함 – 올 초부터 다시 work, work, work 생활이 된 거 같다. 솔직히 요샌 너무 빨리 인생을 달려서 잠시 앉아서 생각을 못 한다. 얼마전에 일부러 시간을 좀 내서 곰곰히 생각해 봤다. 내가 정말 그렇게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걸까 아니면 가만히 아무것도 안하고 생각을 하면 뭔가 불안해서 계속 빨리 빨리 움직이는 걸까. 역시 후자다. 크게 생각해보면 인생 뭐 그렇게 바쁘게 살 필요 없다. 이메일 당장 답변하지 않아도 큰 일 나지 않고 투자 계약서 지금 당장 검토하지 않아도 투자에 큰 지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