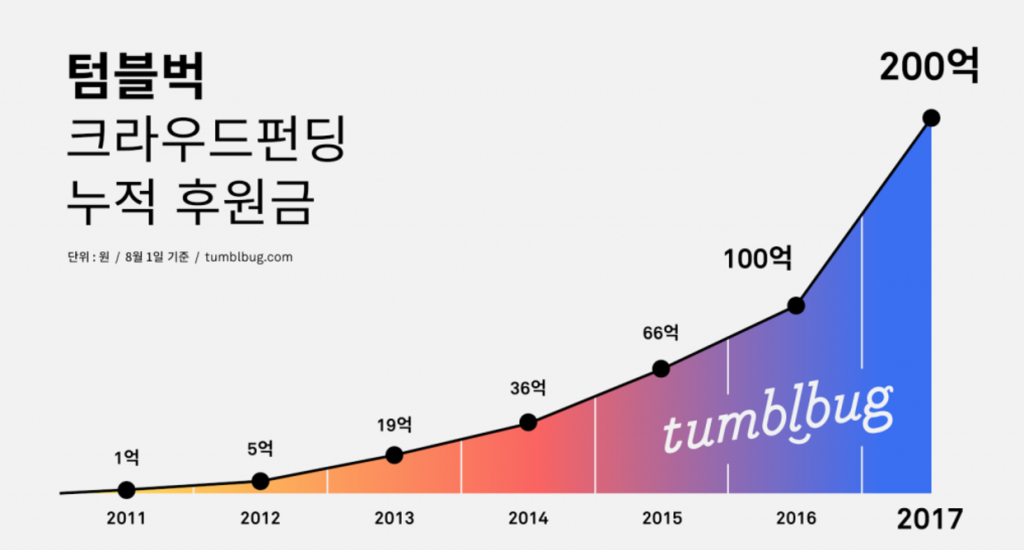스트롱벤처스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기서 포스팅한 적이 있다. 그리고 나랑 존이 어린 시절을 보낸 섬에 대해서도 여기서 포스팅한 적이 있다. 우리가 살았던 Gran Canaria 섬은 인구 백만이 안 되는, 제주도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은 섬이다. 위키피디아를 보면, 이 섬의 수도인 라스팔마스에 거주하는 한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라스팔마스 한인의 기원은 1960년대부터 이 섬을 기지로 원양어업을 하던 선원과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시작했다. 원양어업은 건설업과 함께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외화벌이 주력산업이었는데, 1970년대에는 무려 7,000여 명의 한인이 이 섬에 살았다(이는 라스팔마스 인구 350,000명의 2%). 많은 한인이 가족과 함께 이민 와서 스페인에 정착했고, 2세들을 스페인의 현지 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한국의 원양어업 산업이 하락하면서, 한인 인구는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와중에 많은 한인은 원양어업에서 손을 떼고 다른 산업으로 진출했고, 이들의 후손들은 대부분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꽤 부유하고 성공적인(=relative affluence) 삶을 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에는 창업과 스타트업도 포함된다. 이 작은 섬 출신의 한인 창업가, 벤처투자자, 스타트업 종사자가 몇 명 있는데, 오늘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한국 드라마와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스트리밍 하는 서비스로 시작한 뉴욕의 DramaFever를 창업한 박석 대표와 그의 친동생 박현 이사 모두 우리와 같이 이 섬에서 자랐다. 우리한테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스트롱도 드라마피버 초기에 투자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심하게 반대해서 투자하지 않았다(John은 매우 하고 싶었다). 그때 나는, “도대체 누가 한국 드라마를 보겠냐?”라면서 이 투자를 반대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멍청한 발언이었다. 드라마피버는 2014년도에 소프트뱅크에 좋은 가격에 인수됐고, 나는 후회했다.
우리 첫 번째 펀드에서 투자한 Recomio는 쿠팡에 인수됐는데, 2명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은 서철이라는 친구다. 서철 또한 라스팔마스에서 자랐고, 여기서 존이랑 나랑 같은 초등/중학교에 다녔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철이는 나랑 LA에서 고생하면서 뮤직쉐이크를 함께 운영했던 동료이기도 했다.
실은 레코미오를 쿠팡에 소개하고, 연결해 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쿠팡맨을 만든 쿠팡의 물류 담당(전) 정태혁(Kevin Chung) 이사다. 태혁이도 우리랑 이 섬에서 같이 자랐고, 모두 다 같은 초등/중학교 동창이다. 어릴 적, 섬에서 코 흘리면서 같이 축구하고, 수영팬티만 입고 물장난치던 친구들이 커서 이런 좋은 딜을 같이 할 줄은 정말로 몰랐다.
우리 두 번째 펀드에서 투자한 SnackFever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내가 가끔 포스팅을 한다. 실은 이 회사의 창업자 장조경(Jo Jang) 대표도 우리랑 같이 이 섬에서 자랐다. 조경이는 나보다는 동생인데, 나랑, 존이랑, 위에서 말한 철이랑 태혁이랑 모두 다 같은 초등/중학교/고등학교에 다녔다. 우리가 다니던 학교는 산동네에 있어서 스쿨버스로 약 45분 정도 가야 했는데, 내가 가끔 어린 조경이를 버스정류장까지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아직은 작고, 우리 이름과는 아직은 어울리지 않게 ‘약한’ Strong Ventures를 만든 존과 내가 있다. 페이팔 출신들이 모두 다 엄청난 회사를 만들고 성공해서 이들을 좋은 의미로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끼리 농담처럼 ‘카나리아 또는 라스팔마스 마피아’라는 말을 가끔 한다. 실은, 아직 그 누구도 대단한 성공을 이룩하진 못했지만, 이 작은 섬 출신의 한인들이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스타트업 분야로 진출해서, 성공을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참 재미있다.
참고로, tech 분야가 아니라서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카나리아섬 출신의 가장 성공한 한인 창업가/기업인은 매출 1조 원의 기업 인터불고를 창업한, ‘스페인의 선박왕’ 권영호 회장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