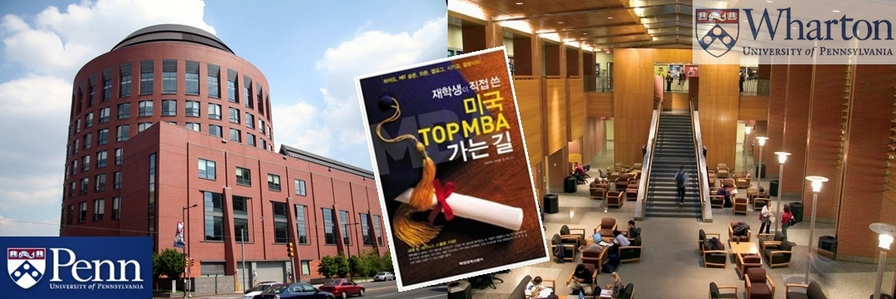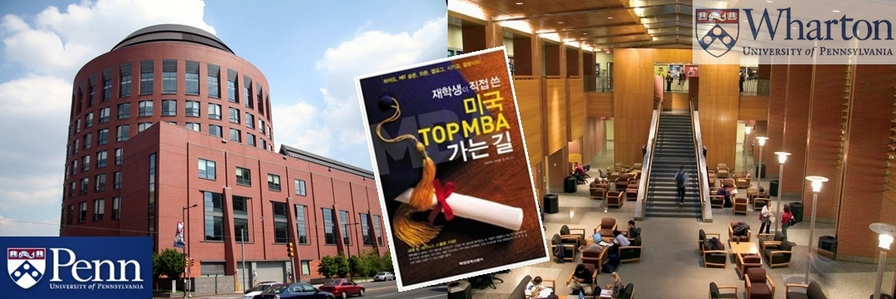
기고자 소개) 박은정 씨는 와튼스쿨 (Wharton School) 졸업한 후 현재 Top MBA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MBA 지원자들에게 도움을 준 경험을 기반으로 “미국 Top MBA 가는길(매일경제)“를 공저하였으며, 현재 자신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최신 MBA 트렌드와 어느 학원에서도 해 주지 않는 진짜 MBA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졸업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일을 했으며 현재 미국 동부 피츠버그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씨의 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mbaparkssa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박은정씨가 운영하는 ‘MBA의 길‘에 가시면 MBA 관련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와튼 MBA에 입학했던 것은 2007년의 일 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비교할 때 비즈니스 스쿨 현장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투자은행의 위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닌데, 제가 학교를 다니던 때만 해도 투자은행은 ‘MBA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컨설팅보다 더 많은 졸업생들이 선망하는 분야였던 투자은행에는 와튼에서만 매년 전체 학생의 1/4에서 1/3에 달하는 인원이 입사했습니다. 골드만 삭스, 모건스탠리, UBS, 시티처럼 지금까지 남아있는 은행들도 있지만, 리만 브러더스나 베어스턴스처럼 이제는 역사속의 이름이 되어버린 은행들도 있습니다. 전체 학생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투자은행에서 일자리를 찾기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뉴욕행 Amtrak을 탔습니다. 비록 살인적인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를 감내할 지언정, 연봉, 특히 보너스는 만족스럽게 받을 수 있는 인기 최고의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들어보면 이제는 소수 특히 관심있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투자은행 설명회에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들해진 관심은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2007년, 하버드 MBA 졸업생의 무려 44%가 금융계를 택했고 그 중 12%가 투자은행으로 들어간 데 비해, 2013년에는 단 27%만이 금융계로 진출했고, 투자은행을 선택한 비율은 단 5%에 불과합니다. 시카고의 경우, 2007년에는 30%가 투자은행을 선택한 반면, 2013년에는 단 16%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단 7년만에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물론 이렇게 된 계기는 금융위기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 3월에는 베어스턴스가, 8월에는 리먼브라더스와 메릴린치가 주저앉으면서 MBA Class of 2009, 2010은 ‘저주받은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취업에 경기불황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금융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스쿨에 진학한 상황에서 특히 금융쪽 경기가 얼어붙다보니 파장의 강도는 더 거셌습니다. 이미 있는 사람들도 대규모로 감원하는데 신규 인력을 채용할 리도 없는 데다가, 리크루팅 관련 예산도 모두 감액되어 뉴욕에서 단 2시간 거리인 와튼스쿨의 설명회조차 취소되곤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은행들은 MBA 채용 규모를 줄였고 그 이후로 크게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일자리의 공급이 줄었을 뿐 아니라, 인기도 시들해졌습니다. 이유는 첫번째, 불황과 신규 규제로 인하여 투자은행 최고의 메리트였던 보너스가 크게 줄었습니다. 두번째, 이제는 은행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우리 조직에서 함께할 지’를 신중하게 고르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투자은행으로 진출하던 MBA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는 의향보다는 나중에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정도로 삼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은행들의 변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을 MBA의 덫(?)으로 이끄는 투자은행의 인기가 시들해졌는데 MBA 입학하기는 왜 여전히 어려울까요? 투자은행 대신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두 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 투자은행과 함께 MBA 취업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웠던 컨설팅의 인기는 이전보다 더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런던비즈니스스쿨의 경우, 컨설팅에 취직하는 인원은 2007년의 23%에서 2013년의 29%로 늘었고 시카고 역시 같은 시기간동안 24%에서 31%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시카고를 졸업한 472명 중 맥킨지, 베인, BCG, A.T. Kearney 단 네 회사에서 뽑아간 인원은 무려 19%에 달합니다. 컨설팅은 투자은행이나 기타 다른 금융권 업무에 비해 더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문제해결능력을 기초로 다양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다가, 나중에 다른 분야로 이직하기에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MBA 후 경력을 쌓기에는 최적의 분야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투자은행의 보너스가 대폭 삭감된 이상,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은행보다 빠질 게 없는 상황입니다.
두번째로 투자은행의 빈자리를 빠르게 메꾸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테크놀로지 분야입니다. 2007년만 해도 대부분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테크나 스타트업은 소수 학생들의 관심사였을 뿐, 학교 쪽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대규모 자원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학교들마다 테크놀로지와 entrepreneurship 쪽에 큰 관심을 두고 서로 경쟁하다시피 육성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테크놀로지 회사들의 MBA 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와 맞아떨어져서, 컬럼비아, 와튼, 시카고처럼 과거에는 금융에 특히 강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던 학교들에서도 테크놀로지 쪽 회사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하는 학생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시카고의 경우 해당 업종으로 진출하는 학생이 2007년에는 단 6%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12%로 두 배로 뛰었으며, 인시아드의 경우에도 가장 많은 학생을 채용한 8개의 회사 중 4개는 컨설팅이었고, 나머지 4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및 구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밑바탕에는 보다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MBA 학생이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이제는 과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근시안적인 금전적인 보상이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이나 본인이 가진 열정을 발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급증하는 창업 붐도 이러한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간에 금융이냐, 테크놀로지냐, 안정이냐, 도전이냐, 사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비즈니스 스쿨에서 끊임없이 확인했듯이, 뛰어난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따라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 못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1회부터 거듭 말씀드렸지만, MBA에 진학하겠다, 라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최소한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유행이나 연봉 같은 부차적인 요소에 휩쓸리지 않고 본인의 비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창업가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유명한 창업가들도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나름 성공한 창업가들도 있다. 또,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비즈니스를 소유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창업가들도 있다. 예를 들면, 동네 빵집 아저씨나 작은 커피숍 주인이 그렇다. 이런 분 중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일하던 분들도 있고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던 명문대 출신들도 많다.
우리 주변에는 창업가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유명한 창업가들도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나름 성공한 창업가들도 있다. 또,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비즈니스를 소유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창업가들도 있다. 예를 들면, 동네 빵집 아저씨나 작은 커피숍 주인이 그렇다. 이런 분 중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일하던 분들도 있고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던 명문대 출신들도 많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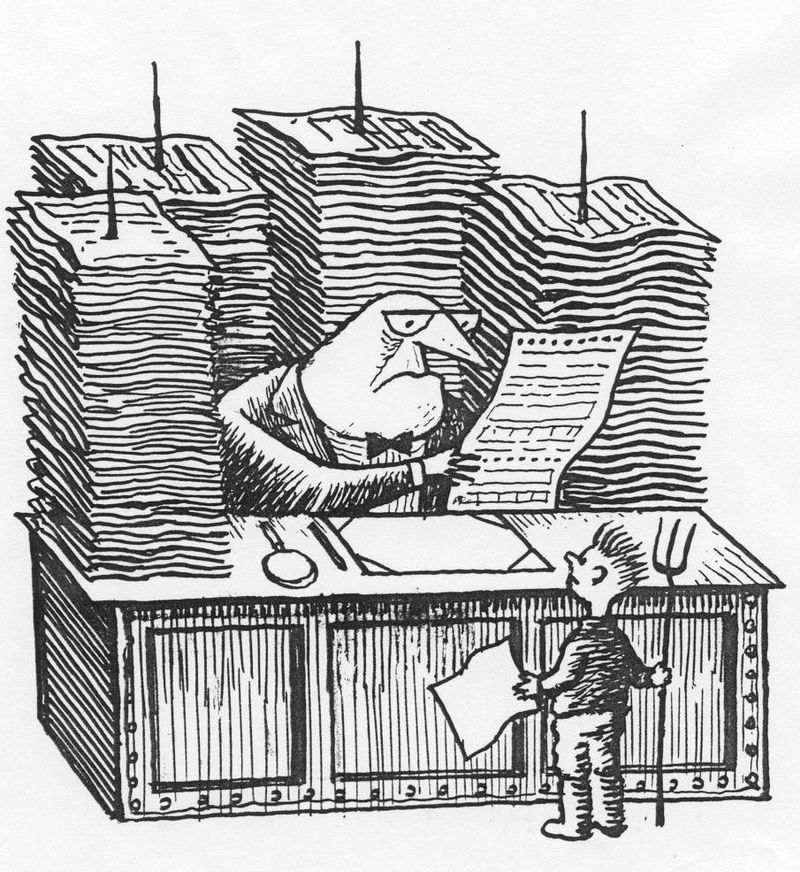
 인터넷 스트리밍/라디오 서비스 판도라 미디어가 지난 주에 2014년 3사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실적 자체는 월가의 예상을 넘었지만, 주가는 거의 20% 정도 하락했다. 뮤직쉐이크를 5년 정도 미국에서 운영하면서 존경 반, 부러움 반으로 벤치마킹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거의 매일 사용하고 듣는 서비스라서 – 주말에 실적 관련 자료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봤다.
인터넷 스트리밍/라디오 서비스 판도라 미디어가 지난 주에 2014년 3사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실적 자체는 월가의 예상을 넘었지만, 주가는 거의 20% 정도 하락했다. 뮤직쉐이크를 5년 정도 미국에서 운영하면서 존경 반, 부러움 반으로 벤치마킹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거의 매일 사용하고 듣는 서비스라서 – 주말에 실적 관련 자료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봤다. 얼마전에 저널에서 Mahindra Genze라는
얼마전에 저널에서 Mahindra Genze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