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5월달에 한국에 나온 3가지 이유 중 하나인 – 그리고 매우 중요한 – 비론치 2014 행사가 지난 주 목요일 막을 내렸다. 양적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 봤을때 대한민국 최고의 IT 행사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한 거 같다. 나는 이번 비론치 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했다:
내가 5월달에 한국에 나온 3가지 이유 중 하나인 – 그리고 매우 중요한 – 비론치 2014 행사가 지난 주 목요일 막을 내렸다. 양적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 봤을때 대한민국 최고의 IT 행사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한 거 같다. 나는 이번 비론치 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했다: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급성장을 경험했는데 비론치는 마치 스타트업계의 88 올림픽과 같아요. 이번 비론치 2014는 모든 면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콘퍼런스 같으면 10년이 걸려 개선됐을 부분들이 고작 3년 만에 정말 기적적인 발전을 이뤘죠. 비론치라는 콘퍼런스는 이제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어요. 이번 행사 때 이야기를 나눴던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콘퍼런스 중 단연 최고였다고 말해요. 일부는 테크크런치보다 나은 점도 많다고 해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이제 불같이 퍼질 거예요. 아무도 그걸 멈출 수 없죠. 올해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아시아 테크 산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싶다면, 비론치로 향하세요. 이런 콘퍼런스가 한국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내년이 정말 기대됩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건 ‘티핑 포인트’ 이다. 솔직히 beLaunch 2012와 2013도 모두 매우 훌륭했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역시 최고의 행사구나 라는 생각을 해마다 하게 만드는 좋은 컨퍼런스였다. 하지만 2014 행사는 과거 2회의 컨퍼런스와는 달리 단순히 “좋은 행사”를 넘어 뭔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운동’의 시작”이라는 느낌을 주었다고나 할까?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비석세스와 Strong Ventures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흥분되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나는 beLaunch 2014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얻은게 너무나 많았다.
-배틀에 참석한 스타트업들과 리허설을 하면서 나는 좋은 창업가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이들과 대화하면서 더 좋은 투자자가 되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비석세스 정현욱 대표와 비석세스 팀을 보면서 나 또한 더 긍정적인 창업자 마인드를 갖게 되었고
-행사 준비와 운영 관련 내 비즈니스 파트너 John과 더 깊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고
-행사 때문에 가족과 2주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더 좋은 남편이 되었고 (된 거 같고)
-행사에 아버지와 장인어르신을 초청했는데 두 분이 너무나 재미있게 경청해 주셔서 많은 생각과 배려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아들/사위가 될 수 있었고
-사촌동생도 행사에 초청했는데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서 더 좋은 사촌형이 될 수 있었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을 비론치 행사 현장에서 만나서 (우연히 또는 약속을 잡아서)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고
-smartness의 전형적인 role model인 Naval Ravikant로 부터는 스타트업 업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배웠고
-친한 친구이자 후배분인 Eric Kim의 ‘소명(calling)’에 대한 연설로부터는 비전과 열정을 배웠고
-좋아하는 걸 하면서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창업가들로부터는 진정한 can-do 정신을 배웠다
종합 해보면, 나는 비론치 2014 행사를 통해서 위의 모든 걸 깊게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더 좋은 사람이 (a better person) 되었다. 정말로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주말에 부모님 집에 잠깐 들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다.
“기홍아.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몰랐다. 솔직히 아빠는 그동안 미디어에 비친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이나 지하철에서 학생들을 보면서 한국 젊은이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었는데 비론치 행사를 이틀 보면서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봤다. 너 참 대단한 일 하고 있구나. 내년 행사도 기대된다.”
<이미지 출처 = http://cc.mcgarrybowen.com/digital/2011/12/mobile-devices-my-tool-for-a-better-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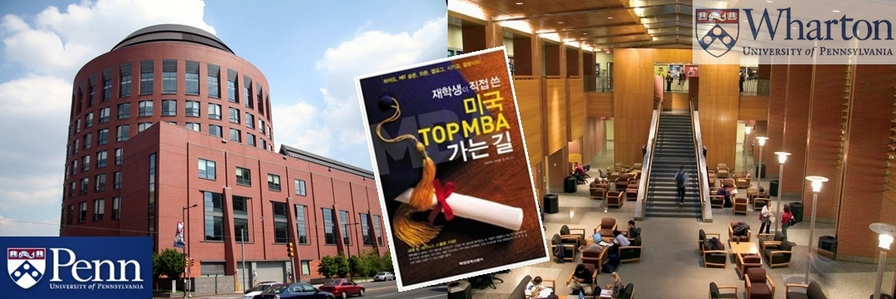
 한 연구에 의하면 4살짜리 꼬마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300개 이상의 질문을 한다고 한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2살 – 5살 동안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40,000개의 질문을 한다고 한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를 먹을 수록 우리의 궁금증은 사라지고 질문의 빈도가 줄어든다. 하루에 300개 이상의 질문을 하던 꼬마가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질문하려는 의욕을 좌절시킨다. 대학 입학 시험은 학생들의 질문보다는 답을 중시한다. 직장 상사는 질문이 너무 많은 직원들을 싫어한다 – 특히 그 질문이 상사의 생각과 반대가 된다고 생각되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무식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질문 하고 싶어도 꾹 참게 되며 이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 버린다.
한 연구에 의하면 4살짜리 꼬마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300개 이상의 질문을 한다고 한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2살 – 5살 동안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40,000개의 질문을 한다고 한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를 먹을 수록 우리의 궁금증은 사라지고 질문의 빈도가 줄어든다. 하루에 300개 이상의 질문을 하던 꼬마가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질문하려는 의욕을 좌절시킨다. 대학 입학 시험은 학생들의 질문보다는 답을 중시한다. 직장 상사는 질문이 너무 많은 직원들을 싫어한다 – 특히 그 질문이 상사의 생각과 반대가 된다고 생각되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무식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질문 하고 싶어도 꾹 참게 되며 이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