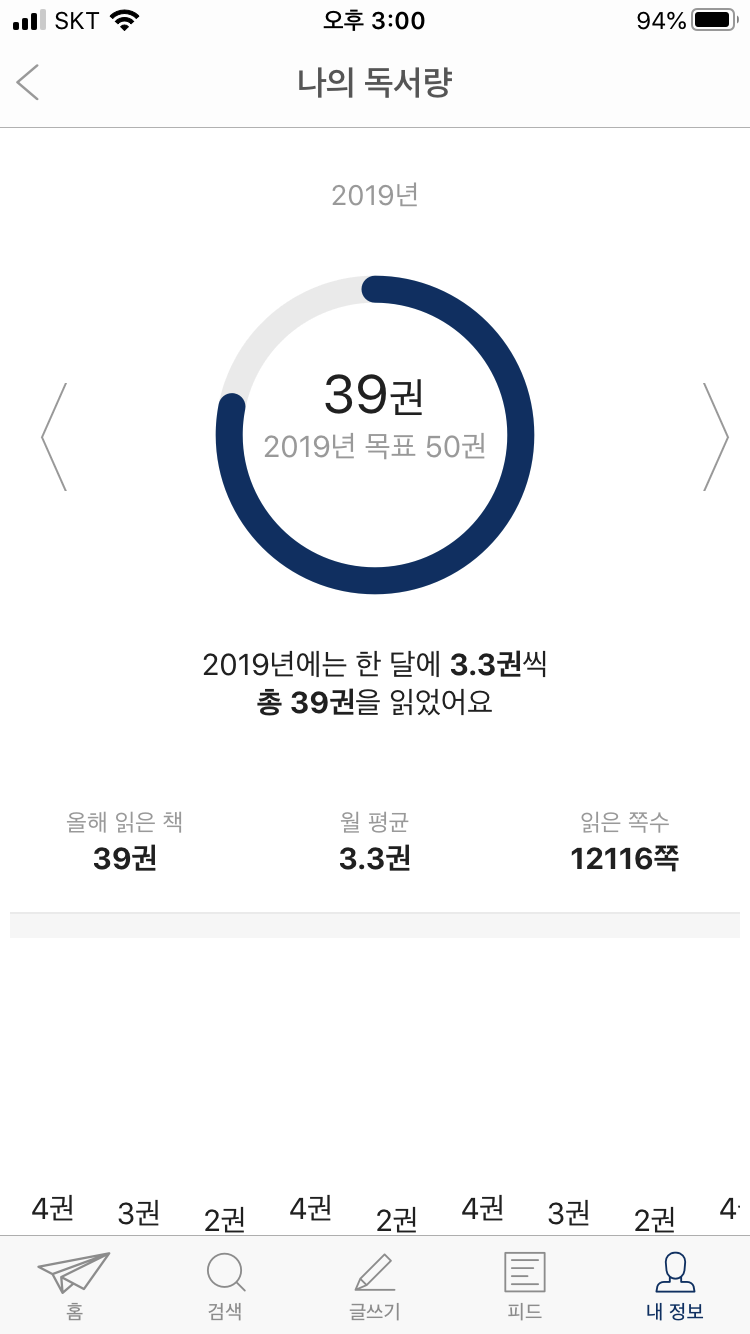Fast Company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30명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떤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답변을 정리한 기사를 꽤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중 내가 동의했던 의견 몇 가지를 공유하고 싶다. 인터뷰한 분들은 유명한 VC, 스타트업의 대표, 그리고 연구원들인데, 앞으로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또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더는 큰 관심 시가 아닐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을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다. 한가지 고려해야 하는 건, 인터뷰한 사람 대부분 본인 회사, 제품, 그리고 직업의 관점에서 유리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30명의 의견을 8개의 주제로 분류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norm이 된 재택근무
2/ 디지털 변화의 가속화
3/ 교육의 가상화
4/ 헬스케어의 변화
5/ 주춤하는 벤처캐피탈
6/ 대중교통의 개인교통화
7/ 제조 공급망의 변화
8/ 변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 코멘트 몇 개를 그냥 특정 순서없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택근무” 실험이 시작됐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실험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인터넷 트래픽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전 세계가 일하고, 공부하고, 교육받는 방법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중국의 근무자들이 서서히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만, Microsoft Teams와 같은 재택근무 솔루션의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3/ Zoom이 “기업”에서 “소비자”로 루비콘강을 건넜다. 우리 가족 5살 꼬마부터 75살 할아버지까지 줌을 사용하고 있다. 이건 대단하다.
4/ 재택근무를 통해서 많은 임원이 물리적인 사무실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다. 많은 조직이 비싼 지역의 큰 사무실을 줄일 것이고, 더 작은 본사와 원격 사무실로 옮길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회사는 본사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옮기고 100% 재택근무를 시행할지도 모른다.
5/ 그동안 도시를 떠나서 일하고 싶었지만, 본사와 사무실의 압박 때문에 그렇게 못 하던 인력이 이 기회를 이용해 지방으로 이동해 원격근무 할 것이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와 같은 테크허브의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고, 지방 도시가 발전할 것이다.
6/ 코로나바이러스는 디지털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변화를 그동안 죽어라 반대하던 반대세력과 저항이 갑자기 증발하고 있다.
7/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엄청난 트라우마와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의료산업에서 정신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8/ 유니콘과 펀딩 규모와 같은 정량적인 부분에 집중하던 투자자들이 이젠 팀, 문화, 수익성 등과 같은 정성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9/ “FOMO(Fear Of Missing Out)” 때문에 투자하게 되는 관행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10/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될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대신, 공유 자전거, 공유 스쿠터 등과 같은 개인교통 수단이 주목받을 것이다.
11/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외국의 공장에만 의존하는 중앙집중형 제조방식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재앙에 무방비 상태다. 앞으로는 인건비가 비싸도, 자국과 외국의 공급망을 유연하게 혼합하고, 사람에 의존하기 보단 기계와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제조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12/ 매출의 대부분을 물리적인 상점과 오프라인 트래픽에만 의존하던 소매업자들은 다른 매출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식당은 이제 방문손님보단 배달에 의존할 것이고, 가게는 매장판매보단 이커머스에 의존할 것이다.
위 12개 의견에 대해서 나는 100% 동의한다. 실은, 이런 변화는 훨씬 전에 일어났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변화가 가속화됐고,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