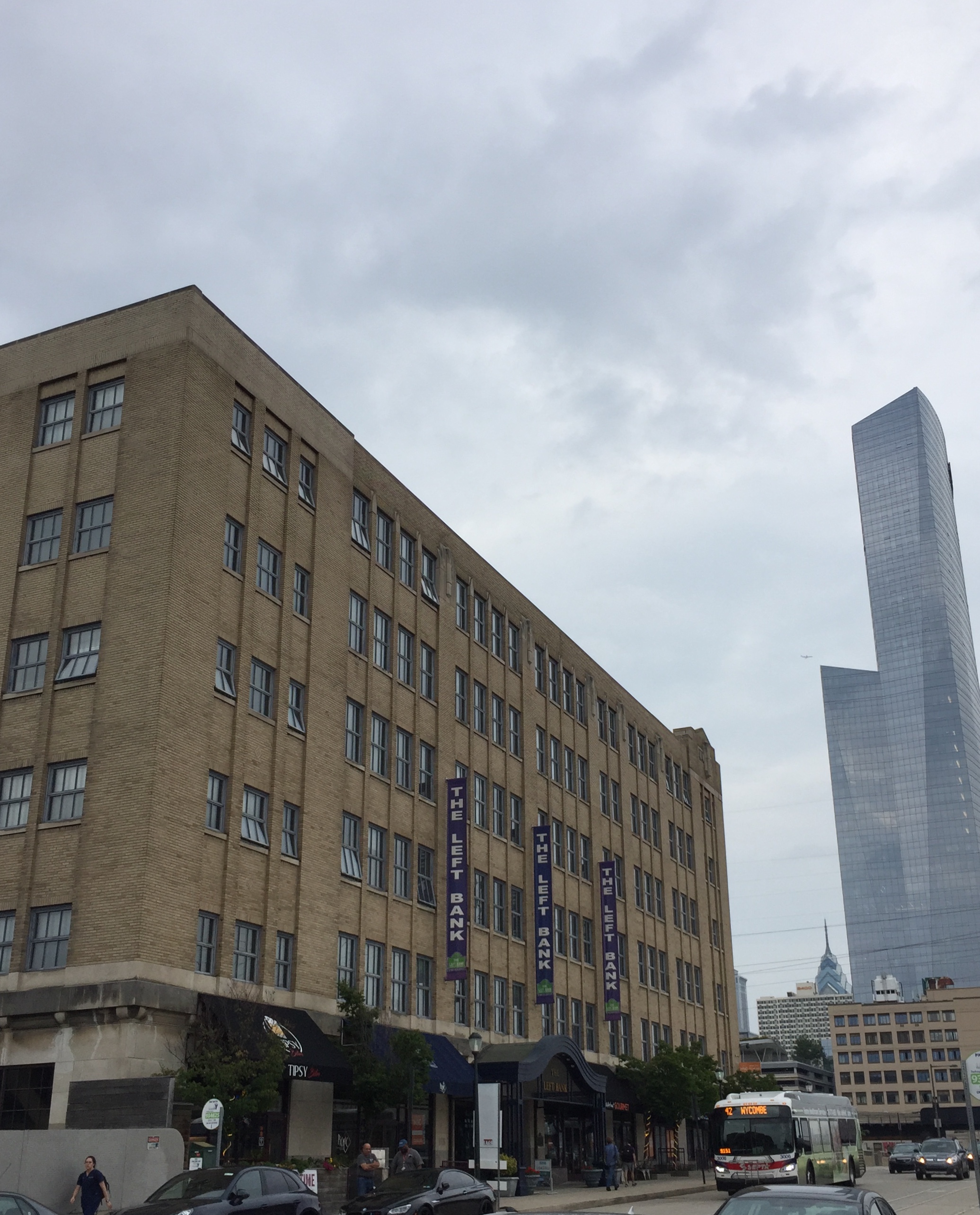우리 투자사 중 온라인 취미 클래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클래스101이 얼마 전에 꽤 큰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투자를 많이 받은 거와 회사가 성공하는 거랑은 상관관계는 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투자를 받으면 두 가지 측면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일단,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내부 자신감이 강해진다. 그동안은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모니터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누군가 외부에서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건, 이렇게 열심히 일 하는 게 헛짓은 아니라는걸 인정하는 거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건, 이렇게 큰 투자를 받은 내용이 보도되면,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인재들은 몸값이 비싼데, 큰 투자를 받은 회사에 입사 지원 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
클래스101은 내가 직접적으로 알고 경험한 스타트업의 컴백 스토리 중 가장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다. 아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재미있고, 술 먹으면서 즐겁게 안줏거리 삼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당시 힘들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 이 컴백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가 전에 잠깐 쓴 적이 있다. 클래스101 투자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나는 미국에 있는 강광욱 교수님한테 카톡으로 감사하다는 문자를 전했는데, 오늘은 강교수님과의 인연, 유니스트와의 인연, 그리고 클래스101 투자에 대해서 좀 써보고 싶다.
2015년 2월 나는 한국에 잠깐 출장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부턴 강광욱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쓴 내용을 그대로 공유한다:
당시 한국을 출장차 방문 중이셨던 Kihong Bae 대표님은 바로 답장으로 (2월 11일 밤 11시경) 유진과 나에게 이메일을 주셨다. 마지막 문장이 “I am actually in Korea right now but leaving on 15th back to LA. Would love to talk / email with you.”
방학이었던 나는 메일을 받고 바로 전화를 했는데 미팅중이었던 터라, 다음날 (2월 12일 밤 11시경)에 답변을 쓴다. “배기홍 선생님..”으로 시작하는..그리고 일정이 맞지 않아 고민하던 차에 2월 15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2층 어느 한식 집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한 시간 여의 짧은 만남을 하게 된다. 창업교육센터를 시작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처음 읽었던 책이 ‘스타트업 바이블’이었는데 당시 배대표님의 첫 소개 말씀이 ‘스타트업 바이블’이라는 책을 썼다 하셔서, 아 그럼 혹시 중앙대 출신 아니시냐며 여쭙다가 동문 선배님임을 알게 되었다. 그날 UNIST의 특강을 요청드리고 다음에 한국 나오실때 (당시에 LA에서 거주 하셨음) 울산에 와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공항까지 쫓아나와준 수고로움 탓인지 기꺼이 응해 주셨고, 다음달인 3월 9일 UNIST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처음 강의를 해주셨다.
그날 공항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 하나가 내가 잘은 모르지만, 뭔가 실속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도와주시라! 였다. 기계연에서 일하면서 정부 프로그램 들의 보여주기식을 좀 알던터라 그리 말씀드렸는데, 당시 Strong Ventures는 초초기 투자를 하고 있었고 남들이 서울할 때 지방의 가능성을 보고 계셨다.
아마도 ‘스타트업 바이블’ 책에서 그 고충과 치열함을 봤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학교라는 인연이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짧은 만남의 강렬한 인상때문일까.. 나 역시 자연스레 의지한 부분이 있었고,
서울에서 beGlobal 서울 컨퍼런스가 있는데 학생들과 와보면 어떻겠냐는 배대표님 말씀에 버스 한대를 이끌고 울산에서 DDP까지 가서 보면서 그 치열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이 무모함이 아마 배대표님께도 조금은 믿음을 주었던지 그 이후 계속 Skype 통화를 하면서 UNISTRONG이라는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되었다.학생들 선발, 지원금, 숙소 선정, 비행기 등 한번도 대규모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준적도 없고 무모 했는데, 우한균 교수님은 뭐 해보지뭐, 내가 알아서 할께 해봐! 라고 하셨던것 같고 배대표님과 나의 실험은 그렇게 한발작씩 나가게 된다. 그 첫해 프로그램에 뽑힌 팀이 페달링, NPC, 그리고 Nspoons. 페달링과 엔스푼즈는 이미 교내에서 두각을 날리던 팀이라 이 팀이 해외연수(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던것 같다. 해외연수로)가 아닌 Incubating을 가는데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것 같다.
여튼 그렇게 인연을 맺게되어 아마 학생들도 Strong Ventures의 배기홍 존남 대표님께서도 처음 프로그램이라 더욱더 많은 시간을 쏟으셨던것 같다. 4주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직접 내가 LA에 가서 보고 학생들과의 1:1 면담, 문제점 등을 물어보았고, 다들 힘들지만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때 LA의 한 소주방에서 노래방 기기(?)를 앞에 두고 소주와 김치찌게가 놓인 긴 방에서 한국/미국인 투자자를 모시고 Pitching하던 장면도 잊을수가 없다. 배대표님께서 조금 웃기죠? 하시며 민망해 하셨던것 같은데 아무렴 어떠냐, 다들 저렇게 진지한데 라고 답변 했던것 같다. 다음날 아마 Strong Ventures와 StudyMode에서 페달링과 엔스푼즈에 5천만원 정도로 투자할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의 강교수님 이야기를 내 버전으로 다시 해석을 좀 해보면…실은 한국 출장 나오면 엄청나게 바빠서, 원래 계획에 없던 미팅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내 원칙이다. 주로 5일 한국 출장 나오면, 오찬 미팅부터 시작해서, 저녁 1차, 2차 까지 하면 하루에 미팅을 7개 정도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한 3일 차 정도 되면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바쁘고 정신이 없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유니스트라는 학교의 교수가 시간을 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귀찮기도 하고, 몸도 피곤하니까, 다음에 한국 다시 나올 때 그때 보자고 한 거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데, 강교수님은 좀 집요했다. 결국, 이분은 이번에 만나지 않으면 LA까지 쫓아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잠깐 보기로 했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유니스트와의 인연이 생겼고, 좋은 유니스트 창업가 회사들에 투자하게 됐다(클래스101, 엔스푼즈/헤이마일로, 10B/씀).
클래스101 후속 투자로 인해 스트롱벤처스 투자사의 기업가치가 올라간 건 투자자로서 당연히 너무 좋다. 그런데 이런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건, 바로 2015년 2월 강광욱 교수님과의 첫 만남 이후, 4년 동안 우리 모두 같이 성장했다는 점이다. 클래스101 창업멤버들은 우리가 처음 투자할 때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던 순진한 학생들이었는데, 이젠 기업의 미션과 가치에 대해서 나랑 이야기하고, 직원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모티베이트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 4년 동안 진흙밭에서 구르면서 학생에서 사업가로 멋지게 성장한 것인데, 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뭐, 그렇다고 내가 뭘 해준 건 없지만, 그냥 옆에서 이 여정을 같이 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강광욱 교수님은 이제 한국을 떠나 미국의 Salisbury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한국-미국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가장 좋은 네트워크와 산지식/산경험을 확보한 한국 교수님이 된 거 같다. 교편을 잡고 있는 교수님이지만, 내 눈에는 이미 본인은 entrepreneur로 성장하셨다.
나는? 나 또한 클래스101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 일단, 사람의 힘은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누가 봐도 망한 회사를 이렇게 멋지게 컴백시킬 수 있었던 건 타이밍과 운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결국엔 이 젊은 친구들이 만든 작품이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는 끝나지 않았다는 다소 상투적인 이 말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남이 끝났다고 해도, 내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이고, 이런 자세와 마음가짐에서 변화는 시작되는 거 같다.
우리 모두 앞으로 같이 더욱더 성장하길.